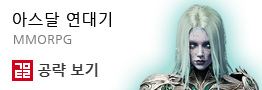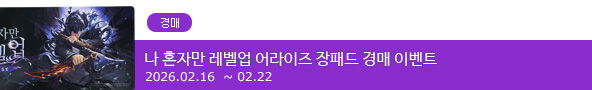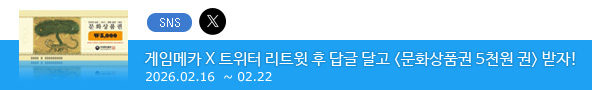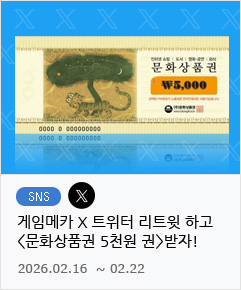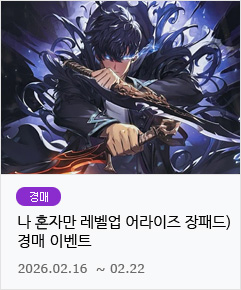※ 편집자 주: 게임메카와 이야인터렉티브는 ‘귀환병이야기’ ‘쿠베린’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판타지 소설 작가 이수영씨의 ‘루나 연대기’를 매주 월/목요일 주 2회 연재합니다. 소설 ‘루나 연대기’는 ‘루나온라인’의 기본 세계관인 블루랜드를 배경으로 한 왕자의 모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
|
톡.
물방울이 떨어졌다.
몇 번이나 물을 갈아 치우고 나서야 키안은 비로소 깨끗한 몸이 되었다. 향료도 없고 쓸만한 향유도 없었지만 키안은 불만을 토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가 살던 왕궁도 아니고 이제 그에게는 시녀도 없었다.
큭 하고 그는 웃고 말았다. 뜨거운 물에 하는 느긋한 목욕이 이렇게나 황송하게 느껴지다니. 대체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던 걸까.
그는 목덜미를 덮는 검은 머리칼을 하나로 묶고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 차가운 칼날이 얼굴에 닿자 시원한 감각이 먼저 들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칼날이 경동맥에 닿자, 자신도 모르게 그는 피를 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뜨거운 피로 범벅이 되어 살아온 시간이 길기도 길었다. 피와 살육이 그의 옷이며 장신구였다.
뿌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눈을 의심했다.
등을 덮는 긴 장발에 시커멓게 얼굴의 반을 덮은 추잡한 수염.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수염을 보고 그는 정말로 기가 막혔다. 야만인이 따로 없다. 이 몰골로 왕자라 떠들어 댔다니 아까 그 천한 것이 웃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는 수염을 깨끗이 밀고 지저분한 장발도 적당히 잘라냈다. 의복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의 의무 중 하나였다. 하지만 물론, 그 의무도 사라진지 오래.
자기도 모르게 킬킬 웃으며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맨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하! 거참.”
낯선 얼굴.
그의 얼굴은 너무 변해서 그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깊게 패인 눈매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둥글었던 얼굴선은 바짝 말라 광대뼈가 툭 하니 튀어 올라와 있었다. 매끈하던 피부는 창백하고 섬뜩해 시체처럼 보일 지경이다. 특히나 원래 푸르렀던 눈은 완전히 변해 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더듬었다. 부왕을 닮았던 푸른 눈은 이제 없었다.
지독하게 비인간적인 붉은 눈이 불길한 빛깔을 뿜어내고 있었다. 핏빛을 닮은 자주색이다.
“맙소사.”
그는 뺨을 슬쩍 쓰다듬어 보았다. 거친 뺨이 울퉁불퉁했다. 왕궁에서 제일가는 미남자라 불리던 얼굴이 엉망이다. 아니, 이건 꼭 저자 거리에 굴러먹던 살인마의 몰골이다. 흉터 가득한 손등이 유달리 거칠어 보였다. 왼쪽 뺨에는 언제인지 기억도 하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샤벨 타이거의 앞발이 긁힌 흉터가 남아 있었다. 이미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야 납득했다. 주점에 들어선 순간 자신을 보던 자들의 경계어린 표정을. 그리고 공포에 찬 시선들을. 무리도 아니었다. 이런 몰골로 들어섰으니 두려웠으리라.
그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입가가 비틀린 웃음.
그 메마른 표정에 그 자신조차 섬뜩했다.
뿌연 거울 속의 남자는, 그가 아는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하얀 얼굴에 사람 좋던 소년의 얼굴은 사라지고 냉혹한 살인마의 얼굴이 존재한다.
“대체 얼마나 긴 세월이 흐른 걸까.”
그는 두 손을 들여다보았다.
창백한 피부와 달리 전신은 지방이라곤 조금도 없는 팽팽한 근육질로 뒤덮여 있었다. 크고 작은 흉터로 몸은 빼곡했지만 몸 상태는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다. 그는 등줄기가 당기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 들리는 기척에 저도 모르게 살기가 일어났다.
‘기다려. 지금은 아냐.’
그는 눈을 반쯤 감고 참아냈다.
바로 그 때 바닥에 늘어져 있던 그의 가죽 망토가 스륵 하고 움직였다. 꿈틀거리던 망토는 점차 흔들리더니 곧이어 둥근 형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곧이어 길고 둔중해 보이는 네 개의 다리가 그늘 속에서 나타났다.
|
|
크르르―
“켈로이.”
어둠만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검은 사자가 어슬렁 걸어와 키안의 뺨에 얼굴을 부볐다. 지독한 악취가 물씬 풍기자, 키안은 그 검은 사자의 몸체를 잡아 당겨 욕조 안으로 쑤셔 넣었다.
“너도 씻어라.”
검은 사자는 으르렁댔지만 반항하진 않았다. 그저 물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충분했다.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먹물처럼 새까만 오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검은 사자가 초라한 방 안을 어슬렁거리는 동안 알몸으로 선 키안은 잠시 거울 속에 보이는 자신을 살피고 있었다.
“거울을 본 것이 대체 얼마만의 일이지?”
그는 클클 웃었다.
작은 창을 열어젖히자, 상쾌한 공기가 피부에 맞닿았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와 공기의 흐름이 살갗에 와 부딪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부르르 떨었다. 이 낯선 공기. 괴물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는 곳이 뿌리는 냄새들.
깊게 심호흡하며 그는 주변을 음미했다. 그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크게 웃음을 터뜨리자 지나가던 사람들 몇이 그를 올려다보며 수군거렸다. 알몸으로 버티고 서서 웃어대는 남자가 이상했으리라. 그들의 시선을 아예 무시한 채 키안은 그저 웃었다. 웃음이 절로 나와 참을 수가 없었다. 황홀했다.
바람, 빛, 음식, 냄새. 두 발로 걷는 양순한 인간들이 대부분인 이 세계.
너저분한 살기와 괴물들이 노리던 그 지옥은 빛조차도 귀했었다.
희뿌연 하늘 아래 시가지가 보였다. 원만하게 굽어진 초승달 모양의 지형이 독특하게 보였다. 집들은 이층이나 삼층집이 대부분이었지만 큼직한 길가로 늘어선 가게들이 자못 번화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새도 그에겐 엄청나게 낯설었다. 검거나 회색 옷을 즐겨 입었던 케난게의 평민들과 달리 이곳의 평민들은 대부분 밝은 색의 옷을 선호하는 듯 했다. 형형색색의 옷가지와 다양한 형태의 주민들이 오가고 있었다.
“이상한 곳이야.”
웃음을 겨우 멈춘 키안은 시커먼 꾸러미 속에서 둘둘 말린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인 그는 느긋하게 연기를 뿜어냈다. 보랏빛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진다. 담배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담배가 아니라 환각과 마비를 유도하는 쿨란잎이었다. 남들은 독초로 분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그것만한 친구는 없었다.
“평민들 주제에 저런 옷을 입다니. 그러고 보니 옷감도 좀 생소하고.”
대체 얼마나 세월이 흘렀으면 평민들이 저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그가 익히 보던 시커멓고 충충한 옷감이 아니라 매끈하고 화사한 색채를 담은 옷감이다. 혹시 이곳은 유달리 부유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일까.
“이종족도 너무 많군.”
그는 창 바로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은발의 엘프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어지간한 일로는 절대로 놀라지 않을 거라 자신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아는 상식으로 이종족은 인간을 꺼리고 인간은 이종족을 꺼린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치안대원이라는 작자조차 드워프다. 그 뿐이랴. 건너편 가게에서는 옷가지를 파는 엘프가 눈에 띄었다.
대체 이곳은 어디일까.
희뿌연 하늘과 낯선 도시, 드워프와 엘프가 인간과 뒤엉켜 사는 도시. 어쩌면 수인족이라 불리는 자들이나, 심지어 마족도 있을지 모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숲 속을 헤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세월은 흐르고 그는 변했다. 그리고 아마 그의 고향도 변했을 터였다.
크르르―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온 켈로이가 위로하듯 그의 허벅지를 밀며 얼굴을 부볐다. 온기는커녕 한기가 치미는 켈로이의 몸체였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키안은 불안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래. 친구. 어디든 상관은 없겠지. 이곳도 사냥터는 있을 테니까.”
그의 눈빛이 차츰 가라앉았다.
케난게의 피를 이은 키안 로혼 발로르는 타고난 사냥꾼이었다. 사냥꾼은 어디서든 굶주리지 않는다.
루나 연대기(The Luna Chronicle) 3화 바로가기
- "월정액 외 추가 BM 없다"던 리니지 클래식, 또 약속 어겼다
- [오늘의 스팀] 아이작 개발자의 뮤제닉스, 판매 1위 ‘압긍’
- ‘찍어낸 얼굴’ 비판 여론에, 오버워치 신캐 ‘안란’ 외형 수정
- 펄어비스, 도깨비 출시 내후년으로 예상
- [오늘의 스팀] 디아블로 2 스팀에 등장, 판매 최상위
- [판례.zip] 리니지 클래식 무한 환불, 유저 처벌 어렵다
- 소년 크레토스가 주인공, 갓 오브 워 신작 '깜짝' 출시
- [순위분석] 클래식 불만 폭발, 기뻐하기엔 이른 리니지
- 신작 내도 겨우 버티는 정도, 2025년 게임업계 '최악의 불황'
- 친구 패스 내놔! '리애니멀' 출시 직후 부정적 리뷰 세례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
2
 발로란트
발로란트
-
3
 FC 온라인
FC 온라인
-
410
 리니지
리니지
-
51
 아이온2
아이온2
-
62
 오버워치(오버워치 2)
오버워치(오버워치 2)
-
72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82
 서든어택
서든어택
-
92
.jpg)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
101
 로스트아크
로스트아크